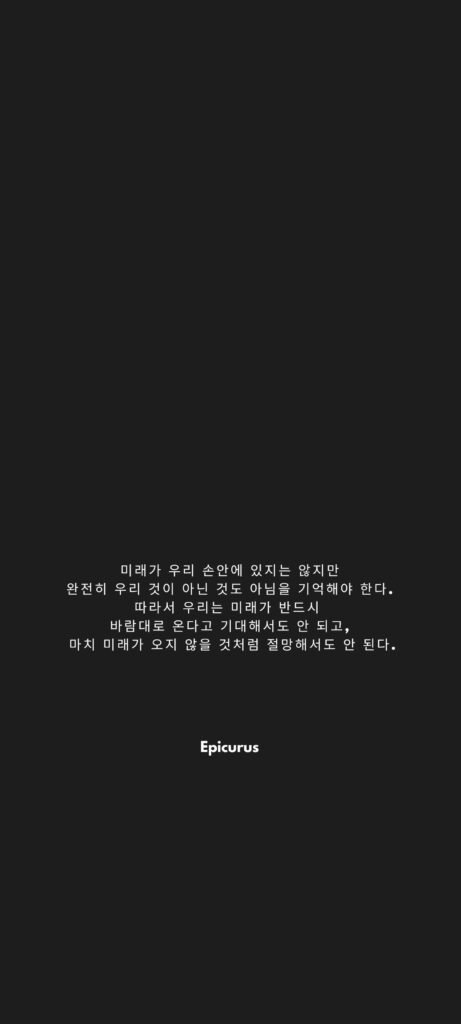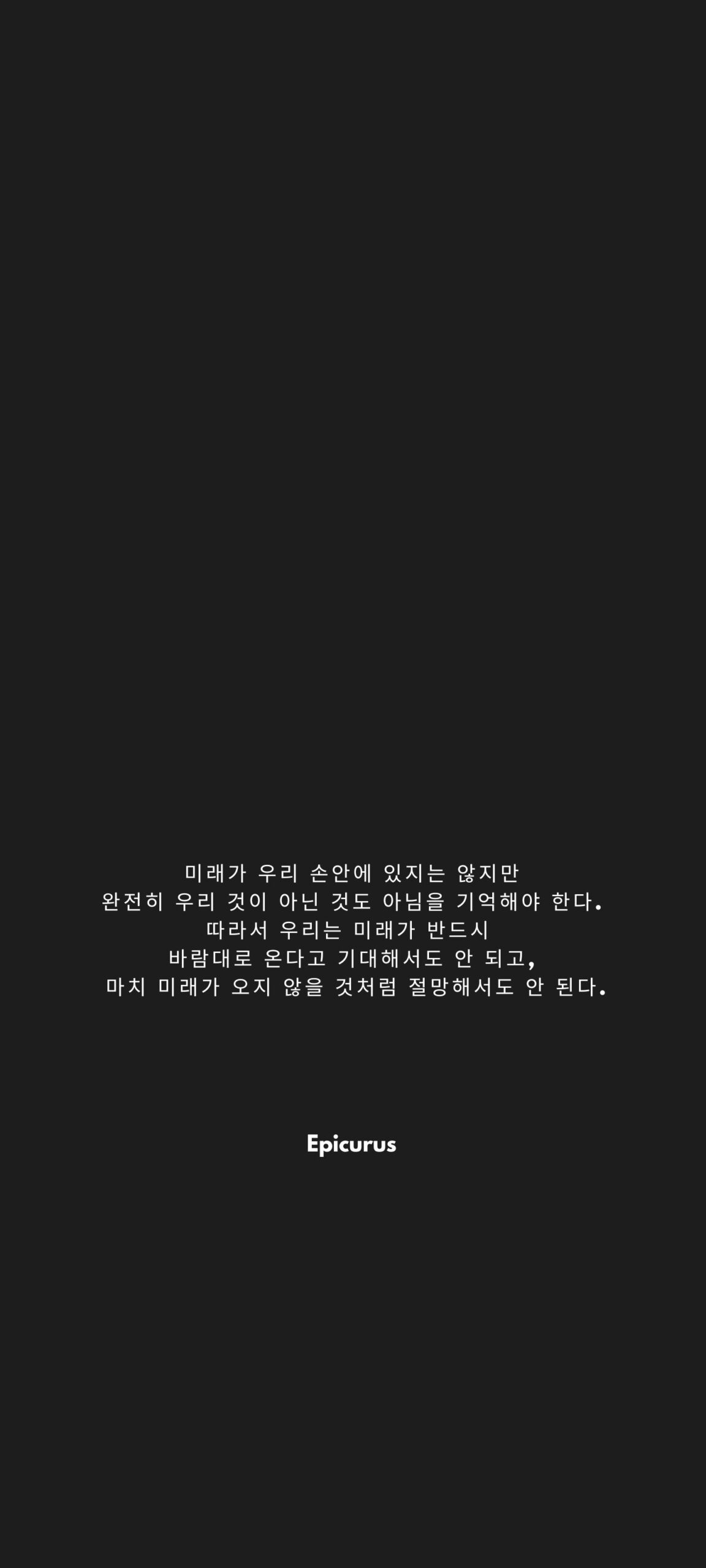마흔다섯 번째 글입니다. 올해도 정원의 나무들은 어김없이 불타는 빨강과 주황, 바랜 노랑 그리고 짙은 초록을 명랑하게 뒤섞었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더미를 밟으면 어찌나 경쾌한지, 방금 기름에서 건져 올린 튀김 한 입 베어 물 때 바삭거리는 소리와 닮았습니다. 생각하면 해마다 계절 이슈는 있었고 이번 가을은 널뛰는 기온입니다. 어제는 분명 반소매를 입었는데 내일은 두꺼운 외투가 필요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날씨예요. 요즘 저는 게으른 정원가가 되어 자연보다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원에 배운 세 가지를 기록해봅니다.
하나, 안달복달하여도 시간은 흘러가고, 꽃은 핀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걱정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하지만 자연은 여유롭습니다. 아무리 네가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안달복달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꽃은 졌다가 다시 필 것이라고 의기양양합니다.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인 나무가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무탈하게 버텼으니 말입니다.
둘, 아름다운 정원에서 중요한 것은 꽃이 아니라 ‘흙’이다.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은 꽃이 아니라 ‘흙’을 잘 가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땅속 깊이 자리한 흙 사이사이 바람이 통하도록 위아래 흙을 뒤집습니다. 정성이 깃든 건실한 토양에서 어떤 꽃이 필지는 이제 정원가의 손을 떠났습니다.
셋, 계절의 변화에 더 자주 감탄하면 웃을 일이 생긴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더라도 기억하는 하늘의 색, 바람의 온도, 볕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조각조각 잘라내듯 구체적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상상으로 쪼개진 세상은 웃을 일 없던 저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의식적인 관찰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울하거나 축 처지는 날에 주변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자체의 힘이 됐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듯 한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급함보다는 신중함과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나의 본질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시선에 대해 생각해보는 오후입니다.